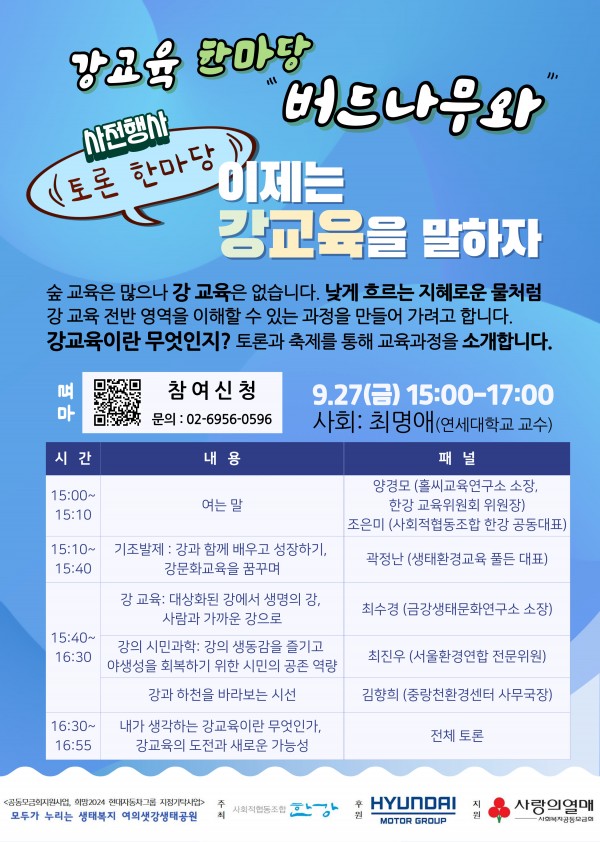|
지난 주말 고향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가을 초입이지만 늦더위가 여전했어요. 제주에 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숲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비자림, 절물자연휴양림, 관절오름 같은 곳들을 걸었어요.
숲에 들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높이 자란 나무들 사이로 올려다보는 파란 하늘이 곱습니다. 풀벌레 소리와 새들의 노래소리, 나뭇잎과 가지들이 뒤척이는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스며듭니다. 나무와 꽃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진 가운데, 숲의 공기는 부드러운 물살처럼 온몸을 이완시켜 주지요. 천천히 걷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도 가지런해집니다.
작년 여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래, 제주도에서 머물다 보면 아버지 생각이 자주 납니다. 특히 숲을 걸을 때 그렇더군요. 혼자 걸어도, 또 언니랑 걸어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으면 같이 명리동 식당에 가서 고기구이에 김치찌개를 먹었겠지, 아버지는 막걸리를 한 잔 하시고, 딸이 주는 용돈봉투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으시며 허허 웃으시겠지… 은덕언니도 숲을 걸을 때는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은덕아. 슬퍼하지 마라. 산다는 게 흐름이 아니더냐.”
언니는 어느 날 숲을 걷다가 아버지의 이 말을 떠올립니다. 갑작스레 사형선고 같은 병 진단을 들은 날, 애닯아 하는 딸에게 아버지가, 나는 괜찮다, 하고 나서 이어 하신 말씀이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