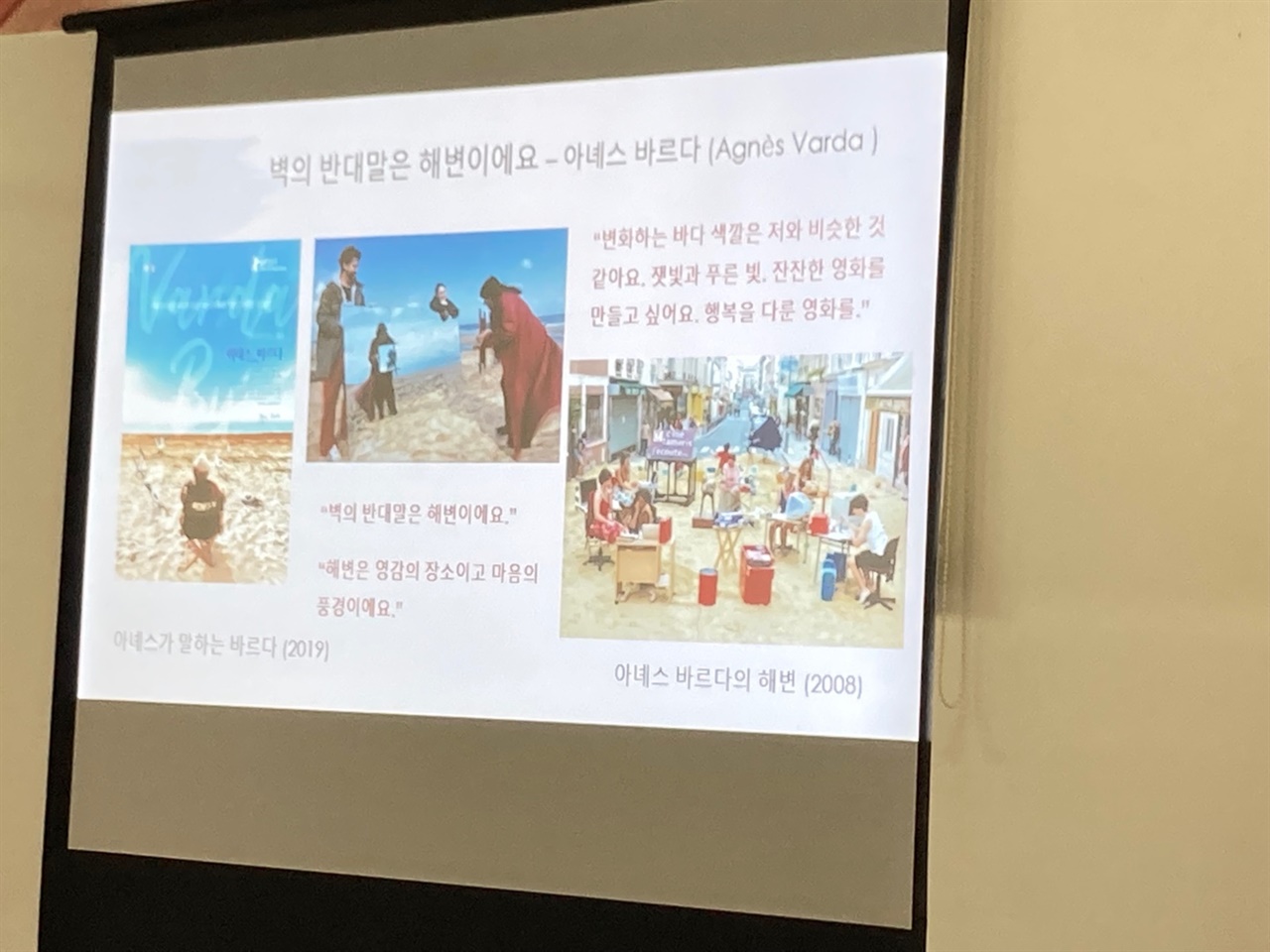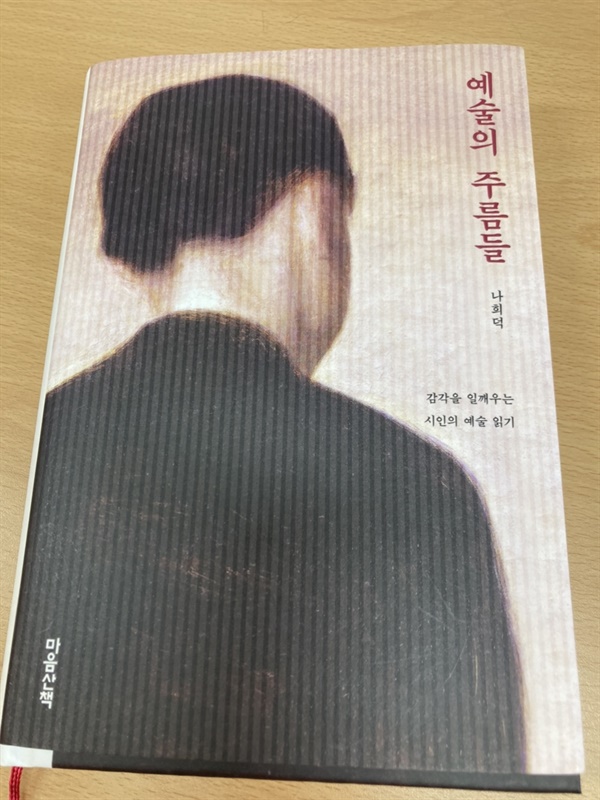몇 달 전에 나희덕 시인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다. 내가 일하는 여의샛강생태공원을 '인문의 숲'으로 가꾸기 위해 시인과 샛강 숲 오솔길을 같이 걷고 싶어서 초대한 자리였다. 시인은 선선히 응낙하였고 만나기로 한 날 나는 서가를 뒤져 그의 시집 <야생사과>와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을 챙겼다. 사인을 받고 싶었다.
일찍이 나는 바람에 흔들리는 법이나 빗줄기에 소리를 내는 법, 그리고 가을 햇빛에 아름답게 물드는 법에 대해 배워왔다. 그리고 가을 햇빛에 아름답게 물드는 법에 대해 배워왔다. 하지만 이파리의 일생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는 낙법에 달려있다.
('결정적 순간' 중에서. 나희덕 시집 <야생사과> 수록작)
<야생사과>는 들춰보니 아이의 열아홉 살 생일 선물로 줬던 시집이다. 가파른 사춘기를 보내고 있던 아이가 시를 읽으며 마음이 여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나희덕 시는 자연에서 가져온 짙은 서정성이 있으면서도 세상의 일들을 가만히 응시하고 살아가는 일에 대해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자분자분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그의 시어들이 가볍지 않은데도 대중적이고 잘 읽힌다. 그리고 그의 여러 시들은 다른 예술 작품, 영화나 소설, 그림이나 사진을 매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왜 그의 시에 이토록 다양한 예술 장르가 녹아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화가나 조각가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진작가나 영화감독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시인이 되었고,
남은 나날 동안 시를 쓰며 살아갈 것이다.
(나희덕 <예술의 주름들> 책머리에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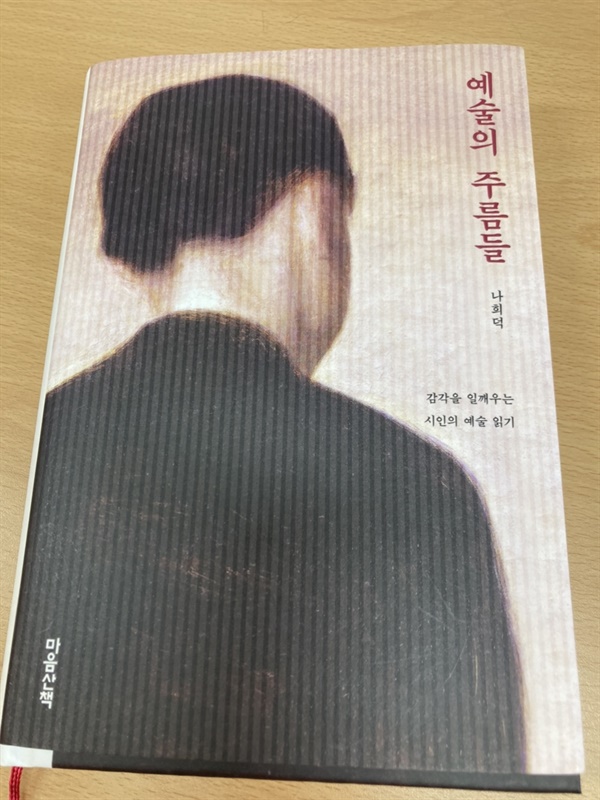 ▲ "예술의 주름들" 책 표지 <예술의 주름들> 책 표지 ⓒ 조은미 ▲ "예술의 주름들" 책 표지 <예술의 주름들> 책 표지 ⓒ 조은미
지난 4월에 시인의 예술 에세이 신간 <예술의 주름들 – 감각을 일깨우는 시인의 예술 읽기>가 발간되었다. 이 책을 읽고 나는 시인이 어디에서 시적인 것들을 가져오는지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예술 장르들이 어떻게 서로 영감을 주고받고 교감할 수 있는지, 그 교감이 얼마나 행복한 체험인지 알게 되었다.
나희덕 시인은 정말로 자라면서 피아니스트도 되고 싶었고, 그림을 좋아하고 직접 그리기도 했으며 사진찍기도 매우 좋아한다고 했다. 그에겐 여러 예술들이 다 매력적으로 다가왔지만 그는 시인의 길을 택했다. 이 책은 그의 말대로 그가 '가지 못했던 길에 대한 선망'을 담기도 하고 '다른 예술 언어에 대해 내 안의 시적 자아가 감응한 기록'이기도 하다.
<예술의 주름들>은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자연을 중심으로 한 생태적 인식과 실천, 여성주의적 정체성 찾기와 각성의 과정, 예술가적 자의식과 어떤 정신의 극점, 장르와 문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 그리고 시와 다른 예술의 만남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3일 여의샛강생태공원에서 북 콘서트 자리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시인은 특히 여성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굳이 여성주의냐 아니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시인은 여성이고, 여성의 삶을 살고 있으니 그의 문학에도 넓은 의미에서 여성주의는 녹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성주의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인간의 삶에서 포착되는 모든 것들이 망라되어 있다.
<예술의 주름들>은 시인에게 영감을 줬던 영화, 미술, 사진,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조곤조곤 말을 걸어주는 책이다. 시인이 시적인 것들을 포착하기 위하여 눈과 귀가 활짝 열려 있음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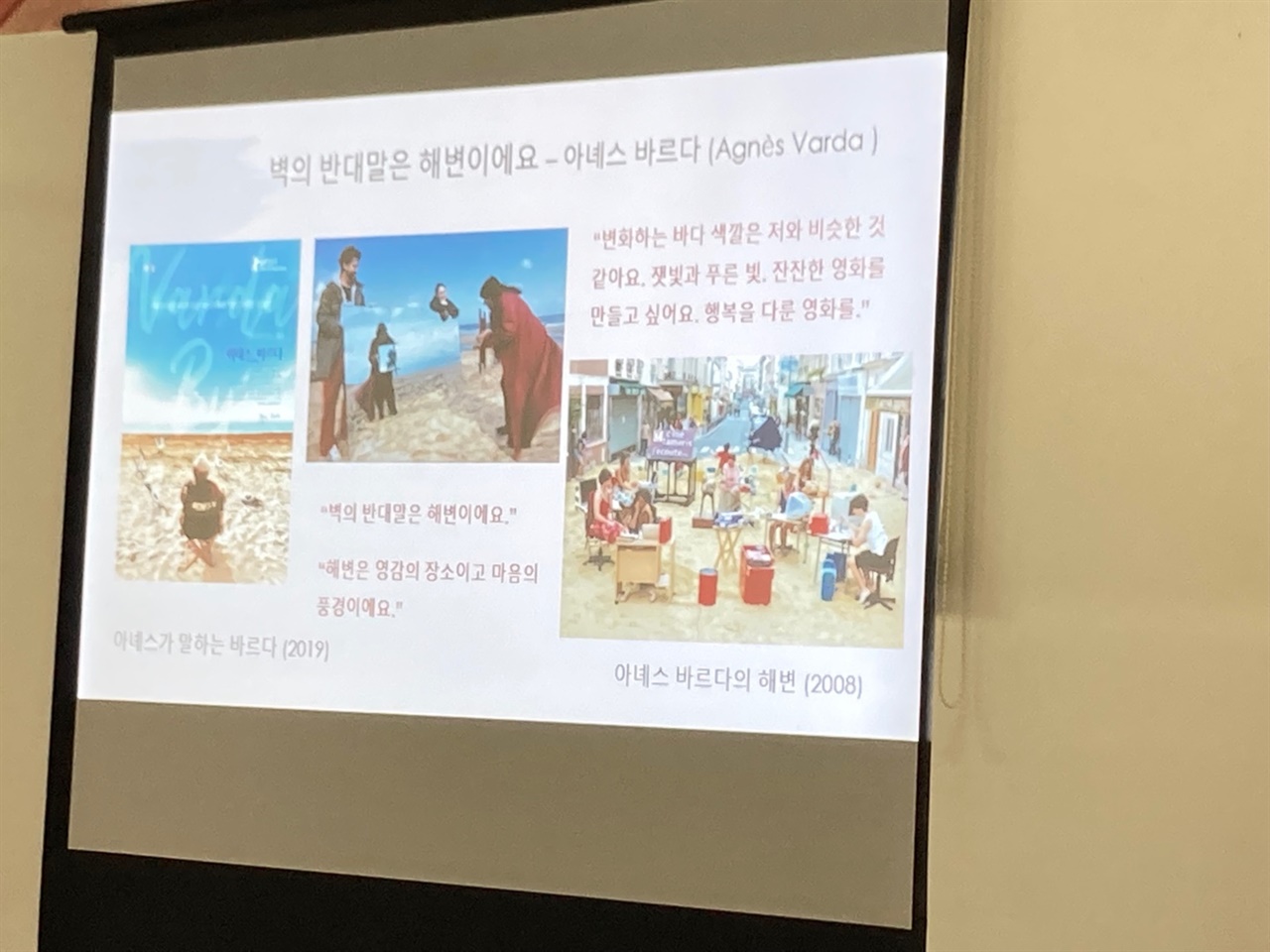 | | ▲ 아녜스 바르다의 해변 영화감독 아녜스 바르다에게 중요한 장소성을 가진 해변에 대해 나희덕 시인이 설명했다. | | ⓒ 조은미 |
나는 시인이 아니지만, 일상에서 시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사유하는 습관을 가져보고 싶도록 하는 책이다. (나는 시인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런 시적인 것들을 끄적끄적 기록한다면 또한 시인이 아니겠는가.) 시인은 영화 <패터슨>을 인용하며 버스 기사 패터슨이 평범한 일상을 변주하는 매개로서 시 쓰기를 하는 것에 대해 말해주었다.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영화감독 아녜스 바르다 같은 할머니가 되고 싶다는 나희덕 시인. 아녜스 바르다의 영화와 삶에는 유머와 재치, 따뜻한 관계맺음과 연대를 통한 온기가 있다. 바르다는 <아녜스가 말하는 바르다> 영화에서 그의 인생에 해변이 갖는 중요한 장소성에 대해 보여준다.
바르다에겐 해변이 있는 것처럼, 나희덕 시인에게는 숲이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그의 애독자인 나는 오늘도 그가 타박타박 걸을 수 있는 숲길을 가꾸고 나무를 돌보는 일을 한다. 시인은 분명 바르다처럼 멋진 할머니로 늙어갈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움이란 늘 바깥에 있는 어떤 것, 타인에게서 발견되는 어떤 것이다.
(나희덕 <예술의 주름들> P.248) 기사 원본보기
|